
봄바람에 취해
절집의 뜨락을 걷는다.
넉넉한 배려를 가진 절집에서
충분히 차분해진 마음이 된다.
기어이 찾아가도 좋을 절집,
개암사다.
어느덧 봄은 오고 만물이 기지개를 편다.
얼어붙었던 개울은 애지녘에 녹아 흐르며 비옥한 땅을 만들고, 초목은 바람에 흔들어대며 제 고운 빛을 자랑한다. 자기를 보아달라며 춤을 춘다.
풀 향과 나무향이 고운 길을 따라 바람도 같이 걷는 길, 봄바람은 길손을 지나쳐 앞서 간다.


절집을 향해 난 오솔길, 가까운 것 같은데 절집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길은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휘어진다. 자연스러운 길이 그리도 편하다.
그 길의 끝에 능가산을 병풍으로 삼아 선 절집, 개암사다.
이른 아침의 봄빛에 절간의 마당은 유독 횐 빛으로 치장을 하고, 단아한 전각들은 저마다의 향배로 아침햇살을 맞는다.
이내, 아까 앞서간 봄바람이 벌써 대웅보전 뒤편의 울금바위를 한 바퀴 돌아오더니 봄 인사를 전하고는 휭하니 다시 왔던 길을 돌아 나간다.


부안 능가산 기슭에 자리한 천년고찰, ‘능가산 개암사(楞伽山 開巖寺)’.
백제 무왕35년(634년)에 왕사 묘련(王師 妙蓮)스님에 의해 창건 되었다. 이 후 문무왕16년(676년) ‘원효대사(元曉大師, 617~686)’와 ‘의상대사(義湘大師, 625~702)’가 우금바위(=울금바위)아래 우금굴에 머물면서 암자를 지어 ‘원효방(元曉房)’이라 했다.
원효방은 조선 후기까지 개암사의 산내암자로서 유지가 되면서 수많은 시인묵객들의 시에 전해지고, 그 중 ‘명원 이매창(名媛 李梅窓)’의 ‘매창집(梅窓集)’을 1688년에 개암사에서 간행되기도 하였다. 또한 ‘진표율사(眞表律師)’가 개암사 부속암자인 ‘부사의방장(不思議方丈)’에서 참선 수행하기도 했다.
절집을 감고 있는 능가산은 백제 멸망 직 후 묘련의 제자 ‘도침(道琛)’이 무왕의 조카 ‘복신(福信)’과 함께 우금바위 아래 우금산성을 세우고 백제부흥운동을 펼쳤던 곳이다.


절집을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능가산의 정상에는 우금바위라 불리는 바위 두 개가 떡 하니 버티고 선다.
마한 효왕28년에 변한의 문왕이 진한과 마한의 난을 피하여 이곳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이곳에 도성을 쌓게 하니 동쪽을 ‘묘암(妙巖)’, 서쪽을 ‘개암(開巖)’이라 하였는데, 이 두 바위를 멀리서 바라보면 ‘바위가 문을 열고 있는 형상’으로 절집의 이름도 ‘개암사(開巖寺)’라 했다.


천년고찰은 고려시대에 들면서 ‘내도솔사(內兜率寺)’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폐허가 되었다가 송광사16국사 중의 한분인 ‘원감국사(圓鑑國師, 1226~1293)’에 의해 숙종1년(1675년)에 불전과 당우를 재건하여 ‘황금전(黃金殿)’을 짓고 ‘대승능가경(大乘楞伽經)’을 설법하면서 산의 이름도 ‘능가산(楞伽山)’이라 불렀다.
그러나 절집은 일제에 의해 다소 폐허가 되었고, 태종14년(1414년)에 선탄(禪坦)스님이 중창하였고, 인조14년(1636년)에 ‘계호대사(戒浩大師)’가 다시 중창하면서 주법당인 황금전을 대웅보전으로 개창하여 현재에 이른다.
절집을 둘러보기 전에 눈에 드는 것이 있다.
길손에게 개암사 하면 생각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울금바위와 대웅보전의 귀공포9룡, 그리고 개암매화다.
울금바위, 또는 우금바위로 불리는 바위로 ‘대웅보전’의 뒤 능가산의 정상에 자리한 두 개의 큰 바위다. 이 울금바위에는 신라고승 원효대사가 수도하던 ‘원효방(元曉房)’이라는 이름의 석굴이 있는 곳으로 석굴 안에는 아무리 오래된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원효샘’이 있다. 바닥에서 생성 되는 샘물은 딱 한바가지 정도의 양만큼 고이는데 ‘물맛이 부드럽고 뒷맛이 달콤한데, 물빛이 뽀얗다.’ 하여 ‘젓샘’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고즈넉한 개암사 둘러보기는 참 곱다.
가까운 곳에 위치한 ‘내소사’가 유명세를 치르는 통에 ‘개암사’는 상대적으로 찾는 이가 드문 공간이다. 그래서 더 넉넉하고, 편하다.
개암사는 3단의 축대위에 가람을 형성하고 있다.
울금바위 아래 본당인 ‘대웅보전’이 자리를 잡고 좌우로는 ‘관음전’과 ‘산신각’이 자리하며, 본당의 앞마당 좌우로 ‘응진전’과 ‘지장전’이 자리한다. 그리고 하단에는 요사와 함께 ‘월성당’, ‘정중당’, ‘종무소’ 등과 함께 ‘범종각’이 머문다.
너른 마당의 한 켠에는 수령 200년의 ‘개암매(開巖梅)’가 겹홍매의 하늘거림을 보이며 고매의 늘씬함을 자랑하고 매해 4월초면 매향을 뿜어낸다. 고매의 수세 건강한 모습과 매향은 길손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는 감로향의 역할을 기꺼이 맡아 준다. 길손이 개암사를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한 ‘개암매’다.

한참을 고매 앞에서 서성이다가 이내 절집을 둘러본다.
길손의 습관은 늘 시계 반대방향으로 도는 버릇이 있다. 정중당과 응진전, 관음전을 둘러보고 대웅보전으로 향하니 발걸음 그 자리에서 ‘턱!’ 멈추게 만든다.
개암사의 매력, ‘개암사 대웅보전(開巖寺 大雄寶殿)’이다.
보물 제292호로 지정된 전각으로 독수리가 비상하듯 날개를 펄치고 있는 팔작지붕의 멋스러움과 내부로 들어서면 우아한 나무의 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격조 높은 공간이 펼쳐진다. 천장에는 9마리의 용이 대들보를 휘감으며 날아오르고 있으며, 우물천장에는 연화문과 당초문, 범자문으로 꾸며져 조선후기에 세워진 불전장엄의 극치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외부와는 달리 단청이 되지 않은 기둥에 시선이 머문다. 자신도 모르게 엄숙한 분위기에 숙연해진다. 밖으로 나오면 목조건물의 보호를 위하여 새로이 단청을 했다. 처마 한쪽에는 백호가, 한쪽에는 용 조각이 마련 된 것 또한 새롭다.
울금바위와 잘 어울리는 공간배치의 대웅보전을 둘러보고 나서 산신각으로 지장전으로 향하였다가 이내 처음의 그 자리에 선다.


규모가 크지 않은 절집은 모든 전각들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너른 마당을 간직한 만큼 넉넉한 마음의 여유인 듯하다. 꽁꽁 싸매고 있는 답답함을 벗어나 한결 여유 있는 걸음으로 만나는 절집의 공간은 오래도록 여행자의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평소에는 촬영하지 않는 전각의 내부 모습을 개암사에서는 기꺼이 담게 된다.
다만, 무분별한 행동으로 열어 놓은 개암사의 배려를 닫히게 만들지 말자.

바위가 열린 문의 형상, 그것을 닮은 절집은 시원스럽게 열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절집을 둘러보는 것이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여유 있게 둘러 볼 수 있었다.
이른 아침의 한가한 시간이어서 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밖의 세상에 나와서인지 풀어 놓은 누렁이 한 마리가 정신없이 뛰어 다닌다. 보통의 절집에 머무는 개들은 ‘묵언수행’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놈은 당췌 가만있지를 않는다. 사람을 어찌나 잘 따르는지 한참을 여행자를 따라 이리저리 정신이 없다. 혹, 개암사에 가시걸랑 무서워 마시라.



어느 봄날의 여행,
여백의 미(美)가 한껏 돋보이는 개암사에서 여유와 휴식, 그리고 조용함과 넉넉한 마음을 만나고 왔다./글.사진=박성환 여행기자

 수원시립미술관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미술관으로 변화 중
[이승준 기자]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관장 홍건표)은 미술관 장벽을 낮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베리어프리(Barrier-free) 미술관을 실천하기 위해 농아인과 시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수원시립미술관은 2020년부터 농아인을 위한 수어 해설 영상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아인 대...
수원시립미술관은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미술관으로 변화 중
[이승준 기자] 경기도 수원시립미술관(관장 홍건표)은 미술관 장벽을 낮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베리어프리(Barrier-free) 미술관을 실천하기 위해 농아인과 시각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수원시립미술관은 2020년부터 농아인을 위한 수어 해설 영상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 감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아인 대...

 '지구의 날' 10분간 소등...울산시, 기후변화 주간 운영
'지구의 날' 10분간 소등...울산시, 기후변화 주간 운영
 볼보트럭코리아, 안성시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볼보트럭코리아, 안성시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진행
 KT-경기도 상인협회, 전통시장.소상공인 업무 자동화 협력
KT-경기도 상인협회, 전통시장.소상공인 업무 자동화 협력
 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행안부-공무원노조, 올해 첫 정책협의체 회의 개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미얀마 설 맞아 문화 교류의 장 개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미얀마 설 맞아 문화 교류의 장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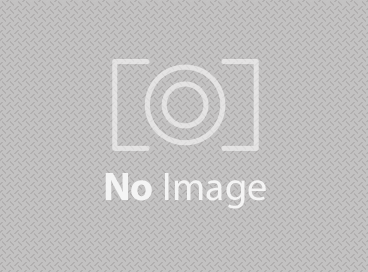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신간] 2022년 제9회 스토리문학상 수상작가 송경하 소설가,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출간
[신간] 2022년 제9회 스토리문학상 수상작가 송경하 소설가,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출간
 뉴진스 다니엘, 설레는 눈빛과 비주얼로 ‘마리끌레르 코리아’ 5월호 표지
뉴진스 다니엘, 설레는 눈빛과 비주얼로 ‘마리끌레르 코리아’ 5월호 표지
 슈퍼6000클래스, 1라운드부터 전운이 감돌아
슈퍼6000클래스, 1라운드부터 전운이 감돌아
 [독자기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독자기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개편 - 문전수거”
 北京 덕승문 (德胜门)의 봄!
北京 덕승문 (德胜门)의 봄!

 목록으로
목록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