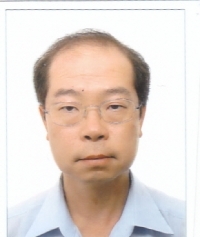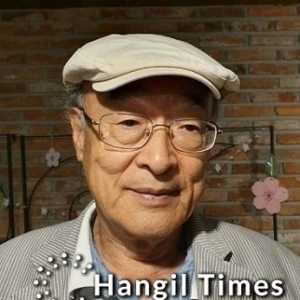- 자연-조화 이룬 한국적인 궁궐 ‘창덕궁(4)’

[이승준 기자] 인정전은 창덕궁의 가장 중요한 건물로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던 대표 공간으로, 돈화문을 거쳐 금천교를 지나면 진선문에 이른다. 이 문은 ‘왕에게 바른 말을 올리다’라는 뜻으로, 인정전으로 들어가기 전 말과 행동을 바로 해 올바른 정치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진선문을 통과해 숙정문과의 사이에 인정전의 외행각이라고 불리는 넓은 공간이 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훼손됐다가, 1996년부터 시작된 재건공사를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회복됐다. 외행각은 사방이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어 엄숙하면서도 진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외행각 마당에서 삼도를 걷다가 왼쪽으로 꺾으면 정전의 출입문인 인정문과 마주하게 된다. 보물 제813호인 인정문은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으로 드나드는 문으로, 연산군.효종.현종.숙종 등 조선의 여러 왕이 이곳에서 즉위식을 거행하고 왕위에 올랐다.

인정문을 통과해 멀리 중앙에 우뚝 솟은 중층 건물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이 ‘어진 정치’를 펼치라는 의미가 담긴 창덕궁의 으뜸 공간, 국보 제225호 인정전이다.
인정전은 1405년 창덕궁 창건과 함께 정면 3칸 규모로 지어졌다가, 확장 개조 공사를 통해 1418년(태종 18)에 완공됐다. 이후 임진왜란 당시 소실됐다가 광해군 때 복구되었고, 1803년(순조3)에 화재로 다시 소실됐다가 다음해 중건된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창덕궁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건물로, 그 규모만큼이나 화려하면서도 정중한 분위기를 지닌 인정전은, 내행각의 일원이다. 이곳은 왕이 혼례를 치르거나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거나 신하들에게 하례를 받는 등 공식적인 국가 행사를 치르던 공간이다.
조선왕조의 위엄을 보여 주기 위한 장소였던 만큼, 큰 행사를 치를 때면 이곳에 모든 문관과 무관이 참석하고, 건장한 병사들이 배치되었고, 악공들도 세웠다고 한다. 이처럼 많은 행사를 지낸 장소인 이 너른 마당을 ‘조정’이라 부른다.

인정전의 조정에는 박석을 깔고, 어도와 품계석을 마련해 국가적인 상징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품계석은 1777년에 설치된 것으로, 정1품부터 정9품까지의 품계가 표시되어 있다. 이 품계석은 행사 때 신하들이 무질서하게 자리한 모습을 본 정조가 제 위치를 정해 주어 질서를 잡기 위해 설치했다.

또 인정전의 단아한 2층 지붕 추녀마루에는 동물 모양의 작은 조각상들이 늘어서 있다. 이를 ‘잡상’이라고 한다. 잡상은 중국소설 ‘서유기’의 주인공과 도교 잡신 등으로 구성된다. 창덕궁의 주요 전각들에서도 이러한 잡상이 눈에 띄는데, 요괴나 잡귀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 준다는 막아 준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잡상은 보통 1, 3, 5, 7, 9, 11의 홀수로 올렸다. 현재 인정전 지붕 위의 잡상은 총 9개로, 창덕궁 건물 중 가장 많은 잡상을 갖고 있다.
잡상 위쪽으로 시선을 올려다보면, 용마루에 새겨진 다섯 개의 자두나무 꽃(이화)무늬를 찾아볼 수 있다. 구리로 만들어진 이 무늬는 인정문에도 있다. 순종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중앙에는 왕이 앉아 정사를 보던 어좌가 자리하고, 그 뒤로 머릿병풍인 곡병 일월오봉병이 놓여 있다. 바닥에는 흙을 구워서 만든 전돌이 깔려 있었으나 지금은 마루로 바뀌었다. 천장에 걸린 전등과 유리창, 커튼 등은 1908년 무렵 서양식으로 개조됐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전기가 들어온 시기와 장소는 1887년 경복궁 건천궁이고, 창덕궁은 1908년 인정전에 전기가 들어왔다./사진-이승준 기자
[철도역 이야기 22] 북한강 푸른 물에 백양리역 [박광준 기자] 백양리역은 1939년 7월 25일 경춘선 보통역으로 영업을 시작, 2004년 역원무배치간이역으로 격하되었다가 2010년 수도권 광역전철 개통으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위치로 이전, 신축했다. 새로운 역사 신축으로 북한강과 멀어진 강촌역과는 달리, 오히려 북한강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새로운 역사는 타는 곳 지붕에는 북한강 물결을,...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서산-태안·보령-부여 광역도로명 부여
서산-태안·보령-부여 광역도로명 부여
 한미-GC녹십자 공동 연구중인 ‘파브리병 치료제(LA-GLA)’ 주목
한미-GC녹십자 공동 연구중인 ‘파브리병 치료제(LA-GLA)’ 주목
 중기부,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본격가동
중기부,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 본격가동
 헌재,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
헌재, 재산 빼돌린 가족 처벌 가능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농가 일손 돕기 봉사...지역사회와 상생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 농가 일손 돕기 봉사...지역사회와 상생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 ‘집중력의 배신’ 출간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 ‘집중력의 배신’ 출간
 ‘D-3’ 에스파 콘서트 키워드는 新 세계관.쇠맛 종합선물세트.역대급 세트리스트
‘D-3’ 에스파 콘서트 키워드는 新 세계관.쇠맛 종합선물세트.역대급 세트리스트
 현대자동차, 미국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 대회서 양산형 전기차 최고 기록 달성
현대자동차, 미국 ‘파이크스 피크 힐 클라임’ 대회서 양산형 전기차 최고 기록 달성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