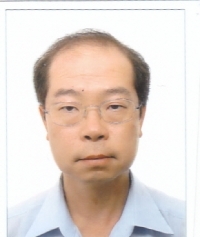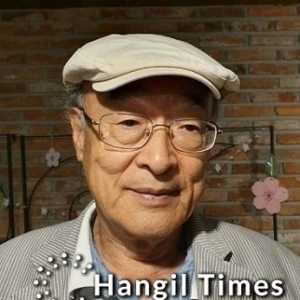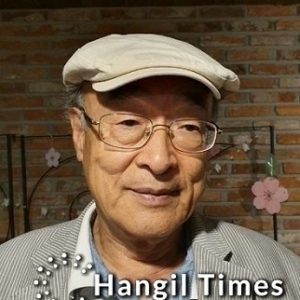- 자연-조화 이룬 한국적인 궁궐 ‘창덕궁(4)’
[이승준 기자] # 옛 선원전
봉모당에서 금천을 지나 선원전으로 향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은 억석루이다.

선원전 남쪽 행각에 위치한 억석루는 ‘옛 날을 생각하다’ 의미로, 조선의 21대 왕인 영조(재위, 1724-17786)가 농사를 가르치고 약을 최초로 발명했던 고대 중국의 전설 속 제왕인 신농씨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내의원에 명하면서 써 준 ‘입심억석(入審憶昔)에서 빌려온 말이다.

아마도 질병 치료에 힘썼던 신농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약을 잘 만들라는 의도가 담긴 듯하다. 억석루는 그 의미로 보아 내의원의 부속 건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된다.
선원전(璿源殿)은 역대 왕들의 초상화[어진,御眞]를 모시고, 생신과 음력 초하룻날 그리고 보름 등에 차례를 지내던 공간이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 시대에는 선대 왕을 기리는 제사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종묘와 함께 혈통과 뿌리를 찾기 위한 왕실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장소라 할 수 있다.

이곳 선원전은 1656년(효종 7) 경덕궁(지금의 경희궁)의 경화당을 옮겨지어 춘휘전이라고 부르던 곳을, 1695년에 왕의 초상화를 봉안하면서부터 선원전이라 불렀다. 이곳에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의 초상화를 모셨으나, 1921년 창덕궁 서북쪽의 외진 곳에 새로이 선원전을 짓고 이 초상을 옮기면서 원래 있던 선원전은 ’옛 선원전‘으로 불렸다. 새 선원전에 보관하던 왕의 초상은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옮겨졌다가 대부분 불탔다고 한다. 지금의 보물 817호로 지정됐다.


선원전은 불필요한 장식이 배제된 간결한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 선원전의 좌우에는 각각 내재실과 진실청이 있다. 이들 부속 건물에서 선원전의 제사상을 준비했다. 선원전 앞에는 제사 공간과 연결되는 향나무의 종류인 측백나무가 있다.
 선원전 뒤편에 자리한 의풍각은 제사용 그릇과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일제 강점기에 신축한 것으로 전한다. 또 선원전 동쪽에는 양지당이 있다. 이곳은 왕이 제사 전날 머물면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던 공간으로, 때로는 왕의 초상화나 왕이 쓴 글씨 등을 궤에 담아 보관해 두었다.
선원전 뒤편에 자리한 의풍각은 제사용 그릇과 도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일제 강점기에 신축한 것으로 전한다. 또 선원전 동쪽에는 양지당이 있다. 이곳은 왕이 제사 전날 머물면서 몸과 마음을 정갈히 하던 공간으로, 때로는 왕의 초상화나 왕이 쓴 글씨 등을 궤에 담아 보관해 두었다.
# 약방.옥당 일원
옛 선원전 일원을 나와 다시 궐내각사를 살펴보자. 금천교 동편의 궐내각사에는 예문관, 약방(내의원), 옥당(홍문관) 등이 있다.
먼저 인정전 서쪽 행각에 자리한 예문관은 왕이 짓는 글과 명령인 전교(傳敎) 그리고 관직의 임명장인 사령서(辭令書) 등을 작성했고, 또 실록 편찬 자료인 사초를 보관하던 곳이다. 참고로 사초는 역사를 편찬할 때 공식적인 자료가 되는 기록으로 사관을 두어 조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실을 작성했다. 이곳에 보관해 두었던 사초를 기초로,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이 만들어졌다.

이어 약방(내의원)은 TV 드라마 속 의녀 대장금이나 의학자 허준 등이 활동했던 공간이다. 궁중의 병원인 이곳은 항시 왕의 건강을 살피도록 했다.
내의원의 수장 격인 도제조는 닷새마다 의관을 인솔, 왕에게 진찰하기를 청했고, 왕에게 올리는 악과 차는 반드시 한강 한가운데의 물을 길어다 은으로 만든 탕관에 달여야 한다.

약방에는 남자 의관뿐 아니라 궁중 여성들의 치료를 담당했던 의녀들도 있었다. 그 수는 많지 않았으나, 남녀 구별이 엄격한 조선시대에 여성의 참여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약방 벽면에 보면 개굴이 있는데 과거에는 화재에 취약한 한옥의 목구조를 보위하기 위해 토벽 바깥 벽면에 돌을 쌓아 올렸다.
이를 화방벽이라 하는데, 격식을 갖춘 건축물은 막돌을 허튼 층으로 쌓는 대신 사괴석, 전돌, 벽돌을 이용해 반듯하게 쌓아 올렸다. 이때 화방석에 굴뚝을 연결하기도 하고, 굴뚝을 세울 수 없을 때에는 사괴석 자리를 남겨 두어 연기 구멍을 만들기도 했다. 이러한 연기 구멍을 개굴이라고 한다.

조선의 27대 왕인 순종(재위, 1907-1910)이 창덕궁에 거처했던 당시, 지금의 성정각은 지금의 성정각을 임시 내의원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성정각은 학술 공간에서 궁중의료기관으로 역할이 바뀌었고, 당시 사용하던 의약 도구 등이 일부 남아 있다.
궐내각사의 옥당은 ’옥같이 귀한 집‘이라는 의미로,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했던 곳 혹은 출세가 보장되는 인재들이 모인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홍문관이라도 불리는 이곳에서는 왕의 학문적.정치적 자문에 응하며, 유교 경전을 관리하기도 했다.
옥당은 기강과 풍속을 정립하고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업무를 보았던 감찰행정 기관인 사헌부와 왕의 잘못을 비판하거나 신료의 탄핵 등 당대의 정치 및 인사 문제에 관여했던 사간원과 함께 언론심사라고도 불렀다.

이 밖에도 이조와 병조 속의 사무용 건물로 인사업무를 담당했던 정청과, 왕의 호위를 비롯한 궁궐 안 군사 업무를 보기 위한 병조 내 관리들의 출장소였던 내병조, 왕의 인장인 옥새 관리와 마패로 관련된 업무를 보던 상서원 등이 자리했다.
참고로 마패는 지름 10cm 내외의 구리 쇠로 만든 둥근 패에 연호, 연월일, 상서원인 등을 새기고, 다른 면에는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말의 수를 1-10마리까지 새겼다. 완성된 마패는 역참의 말과 역졸을 부릴 수 있는 신분증이자, 왕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하는 징표로 사용됐다./사진-이승준 기자
 하정열 작가, 군인에서 별을 노래하는 미술가로 '제30회 개인전'
[이승준 기자]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주제로 우주의 신비를 한지에 먹과 유채로 환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우주화가 하정열 하정열 작가는이달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제30회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일수도 있고, 어린 시절 꿈꾸던 가슴속의 별일 수도 있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
하정열 작가, 군인에서 별을 노래하는 미술가로 '제30회 개인전'
[이승준 기자]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주제로 우주의 신비를 한지에 먹과 유채로 환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우주화가 하정열 하정열 작가는이달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제30회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일수도 있고, 어린 시절 꿈꾸던 가슴속의 별일 수도 있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충남-시즈오카 발전적 미래 만들어 나가자!
충남-시즈오카 발전적 미래 만들어 나가자!
 HD현대인프라코어, 튀르키예 국방부서 대형 굴착기 39대 수주
HD현대인프라코어, 튀르키예 국방부서 대형 굴착기 39대 수주
 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 개최
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 개최
 '이화영 대북송금' 수사 검사 "술자리 회유 등 주장 사실 아냐"
'이화영 대북송금' 수사 검사 "술자리 회유 등 주장 사실 아냐"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 ‘집중력의 배신’ 출간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 ‘집중력의 배신’ 출간
 아일릿, 데뷔기 담은 자체 콘텐츠 ‘SUPER REAL ILLIT’ 첫 공개
아일릿, 데뷔기 담은 자체 콘텐츠 ‘SUPER REAL ILLIT’ 첫 공개
 GT클래스, 이고 레이싱팀 정회원 우승
GT클래스, 이고 레이싱팀 정회원 우승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