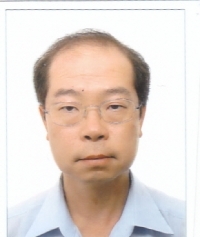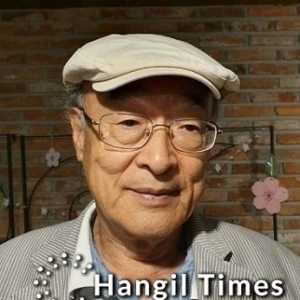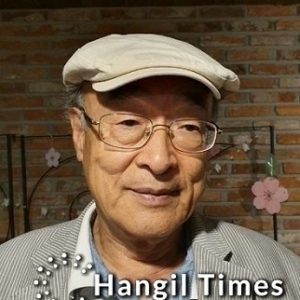[이승준 기자] 장경사는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曹溪寺)의 말사로,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장경사는 성내에 존재했던 9개의 사찰 중 당시의 모습으로 남아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사찰로, 남한산성 동문 안에서 동북쪽으로 약 350m 거리의 해발 360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망월봉의 남사면 중턱 곡저부의 완강사면을 이용해 비교적 넓은 대지를 구축했다.

'광주군지'에는 장경사의 창건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전설이 기록되어 있다. 이 사찰은 인조 2년(1624) 남한산성 수축시 승군의 숙식과 훈련을 위해 건립한 군막사찰이다. 병자호란 당시인 인조 15년(1637) 1월 19일 적이 동쪽 성을 침범해 성이 함몰위기에 빠지자, 어영별장 이기축이 장경사에 있다가 죽을 힘을 다해 몸소 군사를 독전했다. 적이 물러가자 왕이 친히 납시어 위로하고 가선의 품계를 더했고, 완개군에 봉했다고 한다.



1907년 8월 1일 일제의 군대 해산령에 의해, 성안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할 때 다른 사찰은 대부분 파괴됐으나, 그중 장경사가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 그러나 1975년 화재로 소실되어 다시 중창했다.



축성 뒤에도 승군을 주둔시켜 수성(守城)에 필요한 승군의 훈련뿐 아니라 전국의 승군을 훈련시키는 한편 고종 때까지 250년 동안 전국에서 뽑은 270명의 승려들을 교체하면서 항상 번승(番僧)을 상주입번(常駐立番)하게 했다. 1894년 갑오경장으로 승군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전국에서 뽑힌 270여 명의 승려가 교대로 산성을 보수하거나 경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산성 내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10개의 절이 세워졌는데, 장경사가 창건 당시의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 사찰 내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진남루, 칠성각, 대방, 요사체 등이 있었는데, 그 중 대웅전 이 가장 화려한 양식을 가고 있다.



1624년(인조 2) 남한산성의 축성이 시작되자 인조 3년에 승도청(僧徒廳)을 두고 각성(覺性)을 도총섭(都摠攝)으로 삼아 전국 8도의 승군(僧軍)을 동원해 사역을 돕게했다. 승군의 숙식을 위해 전부터 있던 망월사(望月寺).옥정사(玉井寺) 외에 1638년(인조 16) 개원사(開元寺).한흥사(漢興寺).국청사(國淸寺).천주사(天柱寺).동림사(東林寺).남단사(南壇寺) 등 새로운 사찰을 창건했다. 그때 함께 창건되어 오늘날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찰이다.
# 강희 21년명 장경사 동종/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82호
남한산성 장경사 동종은 조선 17세기의 대표적인 승장 사인이 제작한 통도사 종루, 종의 시작품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크기와 하대문양만 다를 뿐 전체적인 형태.세부구조 및 표현이 모두 같다.

또한 사인파가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팔달문 동종과도 하다의 문양만 다를 뿐 전체적인 형태나세부의 표현수법 등이 거의 같은 모양이다. 좀 더 자세히 고찰하면 종의 형태는 한 마리의 용이 그 꼬리로 음통을 휘감고 올라가는 모양의 종뉴아래에 풍만감이 있는 종신이 연결된모양인데, 종신의 외형선은 견부로부터 벌어지며 내려오다 종복부터는 구연부를 향해 살짝 오므라든 선형을 그리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종뉴인데 음통의 상단에는 가장 바깥 부분의 꽃잎은 활짝 벌어져있고, 내부의 꽃잎은 안으로 오므라든 만개한 연화가 장식되어 있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승장계 장인이 제작한 동종에서 나타난다./사진-이승준 기자
영동세계국악엑스포 해외에 알린다....주한외국공관 1:1 협력미팅 참가 [이승준 기자]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조직위(이하 조직위)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대문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하는 제6회 지자체-주한외국공관 1:1 협력미팅에 참가해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 보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협력미팅은 20개 나라 주한외국공관과 국내 24개 지자...

 충남TP, 대만.베트남 55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충남TP, 대만.베트남 550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수출입銀, 카자흐스탄 DBK와 5천만달러 전대금융 설정 MOU 체결
수출입銀, 카자흐스탄 DBK와 5천만달러 전대금융 설정 MOU 체결
 소상공인 대상 1조 원 신규보증 추가 공급
소상공인 대상 1조 원 신규보증 추가 공급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레드벨벳, 타이틀 곡 ‘Cosmic’으로 들려줄 우주처럼 황홀한 사랑 이야기
레드벨벳, 타이틀 곡 ‘Cosmic’으로 들려줄 우주처럼 황홀한 사랑 이야기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