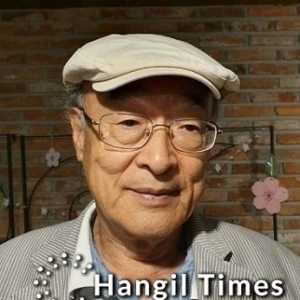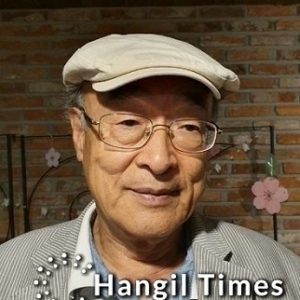[박광준 기자] 극락구품도는 아미타불이 극락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혼을 맞이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으로 아미타신앙을 잘 보여준다. 수국사 극락구품도는 아홉 개로 나눠진 사각형 안에 극락정토의 각 장면을 다양한 인물과 자연물, 건물 등으로 묘사하였다. 흥천사 극락구품도(1885), 흥국사 극락구품도(19세기 말), 봉원사 극락구품도(1905) 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유행한 구품도와 비슷하게 분할 구도로 그렸다. 현재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견지동, 조계사) 불교중앙박물관에 있다.
수국사 극락구품도를 그린 화승 가운데 보암긍법(普庵亘法)이 1905년에 봉원사 대웅전 극락구품도를 그린 것으로 보아 봉원사 극락구품도와 같은 밑그림을 이용했다고 짐작한다. 금박 가루를 아교에 개어 만든 금니와 함께 짙은 색을 다양하게 사용해 매우 화려하면서 민화를 떠올리게 한다. 그림의 선이 빼어나고 표현력이 매우 꼼꼼해 왕실이 발원한 불화로서 품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극락의 구품연화대를 묘사한 구품도로, 1907년 강재희가 황제 폐하 이하 태자.영친왕.의친왕 부부를 위해 조성한 왕실 발원 불화이다. 편수 보암 긍법과 두흠, 금어 재원, 기정, 상은이 그렸으며, 강문환.김종성.원일상 등이 감동(監董)을 맡았다.
구품탱은 격자형으로 나눠진 9개의 사각형 안에 각기 독립적인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이 같이 화면을 분할하는 구도법은 개운사 팔상도(1879), 흥천사 극락보전 극락구품도(1885), 지장사 팔상도(1893), 경기도 불암사 16나한도(1897), 흥국사 극락구품도(19세기말), 봉원사 극락구품도(1905), 수국사 16나한도(1907), 청룡사 팔상도(1915)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 시기 서울, 경기지역 불화의 특징적인 구도법이라 할 수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아미타극락회(阿彌陀極樂會)가 묘사되어 있고, 그 주위로 구품연못이 배열되어 있다. 높은 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보살과 10대 제자, 사천왕, 팔부중, 천중 등이 둘러싸고 있다. 권속들은 모두 3단으로 비스듬히 배치돼 있는데, 흥천사 구품도, 흥국사 구품도, 봉원사 구품도 등에서 인물만을 가득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수국사 구품도에는 화면의 좌우에 수목을 배치하여 화면 구성이 훨씬 여유가 있어 보이면서, 아미타불의 신광 및 화면 하단을 금박으로 처리하며 화려한 느낌을 준다.
극락회의 향우에는 보살의 극락정토참예도(極樂淨土參詣圖)가 그려져 있다. 이것은 아미타불 회상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드는 보살의 무리와 동자상, 그리고 무악천인 등을 그린 것인데 배경의 전각과 연못에는 극락조와 연꽃 등이 살고 있다.
극락회의 향좌에 묘사된 성중극락정토참예도(聖衆極樂淨土參詣圖)에는 극락의 주악천인들과 아미타불 회상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오는 7인의 성문상 등이 묘사됐고, 그 배경으로 극락조와 여러 자연물(노송, 구름, 연꽃 등)들로 이루어진 전각과 연못이 표현됐다.

극락회의 바로 아래에 자리한 극락정토의 장면은 16관(觀) 중 제6총관(總觀)에 해당하는 관으로 보수(寶樹), 소나무, 대나무, 기암괴석 그리고 중층 지붕의 전각이 화면에 크게 그려져 있다. 전각의 앞으로는 활짝 핀 연꽃과 연잎으로 가득한 연못이 있고, 주변의 곳곳에는 코끼리, 금모사자 등이 보인다. 제6총관의 좌.우와 하단의 3면에는 극락왕생의 왕생정토를 표현하였다. 왕생장면은 극락정토를 상품(上品).중품(中品).하품(下品)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각 상.중.하로 나누어 아홉 장면을 설명한 것인데, 이 장면들은 이에 따른 표현이다.
하단 중앙에 자리한 제14관에 해당하는 상품(上品)에는 화면의 반이 연못으로 이뤄진 구도로, 연못에는 관모에 관복을 입은 왕생자, 동자형의 왕생자 등 4명의 왕생자가 활짝 핀 백련 위에 앉아 있다. 왕생자의 위쪽에서는 입상의 부처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면서 왕생자들을 향해 광명을 비추고 있다. 왕생자들이 있는 연못 위 정토에는 다양한 전각과 기암괴석, 여러 수목 등이 4마리의 기린, 2마리의 극락조와 잘 어울려져 있다.
제6총관의 향우(向右)에 위치한 장면은 제15관 중품(中品)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자형의 속인 모습을 한 4명의 왕생자를 아미타불좌상이 맞고 있는 장면을 묘사했다. 아미타불은 오른손을 어깨 위로 치켜들고 왼손은 무릎에 두고 정면을 향해 앉아있는데 아미타불에게서 뻗어 나온 빛이 연못 속의 백련 위에 앉은 왕생자를 비추고 있다. 배경에는 중층의 전각과 기암괴석, 수목, 극락조와 금모사자, 그리고 괴석과 수목의 뒤로 오색을 발하는 금탑(金塔)이 보인다. 하단의 중품(향우)에는 구름을 탄 2구의 보살입상이 연못 속의 속인형 왕생자 3구를 맞는 장면으로 보살의 지물인 연꽃에서 광명이 나와 왕생자를 비추고 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학과 낙타 등이 정토에서 노닐고 있는 모습이 묘사됐다.
제6총관의 향좌(向左)에는 제16관 하품(下品)이 배치되어 있다. 연못 속에는 붉은색의 옷을 입은 2명의 왕생자와 옷을 입지 않은 3명의 왕생자가 백련 위에 앉아 합장하고 있으며, 화면의 상단 우측(향좌)에서는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구름을 타고 왕생자를 맞이하러 오는 모습이 보인다. 그 주위는 여러 수목과 전각, 그리고 극락조와 기암괴석 등이 묘사되어 있는데, 2층 전각의 지붕을 금니로 칠해 매우 화려해 보인다. 이 같은 장면의 아래(하단 향좌)에 묘사된 또 다른 하품의 연못에는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의 내용을 반영하듯이 연못에는 왕생자의 모습은 표현되지 않았다. 이것은 십이겁(十二劫)이 지나야 하품왕생자의 연꽃이 핀다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배경에는 수목과 괴석, 학, 사슴 등이 그려져 있다.
수국사 구품도는 흥천사 극락구품도(1885年), 흥국사 극락구품도(19세기말), 봉원寺 극락구품도(1905년) 등 19세기말~20세기초반 서울, 경기지역에서 유행한 구품도와 매우 유사한 구도를 보여준다. 수국사 구품도를 그린 화승 중 보암 긍법이 이보다 2년 앞서 1905년에 봉원사 대웅전 구품도를 그렸던 것으로 보아 봉원사 구품도와 동일 초본을 이용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채색은 금니와 함께 진채색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매우 화려하면서도 마치 민화의 극채색을 연상케 한다. 필치 또한 수려하고, 문양의 표현 등 그 표현력이 매우 치밀하다고 하겠다.
수국사 구품도는 1907년 강재희가 황제 폐하이하 태자.영친왕.의친왕 부부를 위해 조성한 불화로 이 시기 서울 경기 지역 불화의 특징적인 분할구도법을 사용했고 민화를 연상케 하는 배경과 채색 등이 왕실발원 불화로서의 품격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사진-국가유산청
 ‘사교계의 여왕’ 전수미, 관객 매료 시킨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뜨거운 박수 속 성료
[이승준 기자] 뮤지컬 배우 전수미가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마지막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지난 3개월간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에서 ‘엘렌 베주코바’ 역으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뮤지컬 배우 전수미는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더욱 뜨거웠고 더웠던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었다. 좋은 ...
‘사교계의 여왕’ 전수미, 관객 매료 시킨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뜨거운 박수 속 성료
[이승준 기자] 뮤지컬 배우 전수미가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마지막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지난 3개월간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에서 ‘엘렌 베주코바’ 역으로 많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뮤지컬 배우 전수미는 “여러분과 함께했기에 더욱 뜨거웠고 더웠던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이었다. 좋은 ...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충남도, 지역·민과 일본 시즈오카현과 외교 강화
충남도, 지역·민과 일본 시즈오카현과 외교 강화
 2024 상반기 택견 최강자 탄생...박진영 2년 연속 택견 최고수 등극
2024 상반기 택견 최강자 탄생...박진영 2년 연속 택견 최고수 등극
 대한항공 ‘국방산업발전대전’ 참가
대한항공 ‘국방산업발전대전’ 참가
 중기부, 청년세대 중소.벤처기업 정책 제시 경진대회 개최
중기부, 청년세대 중소.벤처기업 정책 제시 경진대회 개최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기능 회복 위해 의사 확충해야”
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기능 회복 위해 의사 확충해야”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이영애 "숭고한 희생 기려"...천안함재단에 5000만원 기부
이영애 "숭고한 희생 기려"...천안함재단에 5000만원 기부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