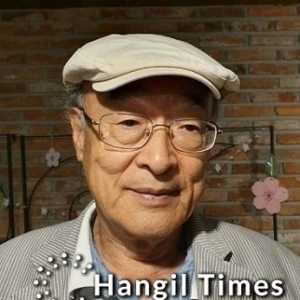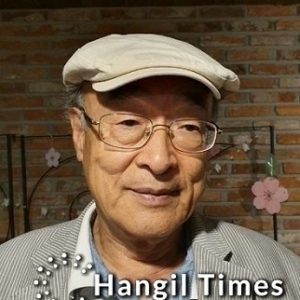[박광준 기자] 염불사는 안양 삼성산 중턱에 자리 잡은 조계종 사찰로, 화성 용주사의 말사이다. 대웅전을 비롯해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영산전 등이 있으며, 염불사 부도 (안양시 향토문화재)와 수령 500년 이상 된 보리수(경기도 지정 보호수)가 있다.









예로부터 삼성산은 신라시대의 고승, 원효와 의상, 윤필대사가 삼성산에 초막을 짓고 수도하다가 원효는 삼막사를, 의상은 연주암을, 윤필은 염불암을 창건했고 이때부터 삼성산이라는 산의 명칭도 함께 유래되었다고 한다.





'여지도서' 등 조선시대 지리지에 이 지역 사찰로 호압사, 삼막사 등과 함께 염불암(지금의 염불사)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조선 전기에는 풍수지리상 한양의 백호에 해당하는 관악산의 지맥을 누르기 위한 관악산 일대에 사칠을 중창했는데, 이때 염불사도 함께 중창되었다.



조선 후기에 와서는 1856년에 도인 스님 등이 칠성각을 건립했고, 6.25 전쟁 전.후로 산신각과 대웅전, 삼성전, 요사 등이 신축되되거나 중수되었다. 1968년에는 기석 스님이 꿈에 미륵보살을 보고 5년에 걸친 불사 끝에 대웅전 뒤편에 높이 8m에 이르는 미륵불을 건립하기도 했다.




한편 안양시 향토문화재로 지정된 염불사 부도는 총 5점으로, 그 가운데 3점은 원통형 부도이고, 2점은 바위벽을 파서 만든 마애부도이다.






관악산, 삼성산 일대에는 불성사 마애부도를 비롯해 다른 곳에서는 보기 어려운 마애부도가 여러 기 분포하는데, 염불사 마애부도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부도의 간략한 형식 변화와 암벽을 이용한 조성 방식 등에서 시대와 양식, 지역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 염불사 부도/안양시 향토문화재 제2호

염불사 부도는 조선 시대 후기에 만들어진 석종형 부도 3기를 말한다. 승려 등 불제자의 사리난 유골을 모신 시설을 부도라고 한다. 부도는 그 모양에 따라 몸돌과 지붕돌 등의 평면이 팔각형인 부도와 몸돌이 종 모양으로 된 석종형 부도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팔각형 부도는 통일 신라와 발해가 양립하던 남북국 시대에 크게 유행한 후 고려 시대 를 거쳐 조선시대에까지 이어졌고, 석종형부도는 고려 시대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조선 시대에 주류를 이루었다.



염불사 부도는 받침을 위에 종 모양 몸돌을 설치하고 , 다시 그 위를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장식했다. 몸돌 앞면은 직사각형으로 편평하게 깎아 부도에 모신 사람의 불명과 부도 조성 시기를 새겨 놓았다. 이를 통해 앞에서 볼 때 왼쪽부터 도일당 부도, 안봉당 부도(순조 16년, 1816) 조성, 서영당 부도(순조 10년, 1810)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염불사 부도에서 조선시대 후기 승려들의 소박한 삶과 그 당사의 부도 양식을 살펴볼 수 있다./사진-박광준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12] 세계문화관/고대그리스도-로마(4) [우성훈 기자] 로마 미술의 이룬 특별한 업적으로 사실적인 초상을 발전시킨 점을 꼽을 수 있다. 로마의 패권이 지중해로 확장되면서 그리스 조각을 모델로 한 초상 조각이 만들어졌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인들과 달리 노화를 존경스럽게 바라보았다. 나이 든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초상의 주인공을 성공적인 삶의 본보기로 여기고 칭송...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홍성군, 홍성군립국악관현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 개최
홍성군, 홍성군립국악관현악단 제8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신용보증재단-농협, 경영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손'
충남신용보증재단-농협, 경영난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손'
 중기부, 청년세대 중소.벤처기업 정책 제시 경진대회 개최
중기부, 청년세대 중소.벤처기업 정책 제시 경진대회 개최
 ‘대전빵차’ 첫 전국투어...꿈돌이 매력 ‘풍덩’
‘대전빵차’ 첫 전국투어...꿈돌이 매력 ‘풍덩’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신간] 도서출판 문학공원, 김선영 시인 첫 시집 ‘하늘포목점’ 출간
 윤송아 '환상적인 아트 퍼포먼스' 한중 사로잡다
윤송아 '환상적인 아트 퍼포먼스' 한중 사로잡다
 장현진, 2024 나이트 레이스 첫 밤의 황제 등극
장현진, 2024 나이트 레이스 첫 밤의 황제 등극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