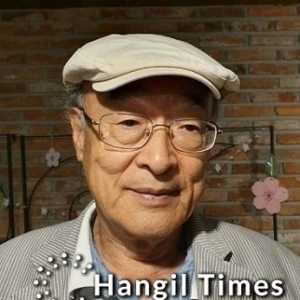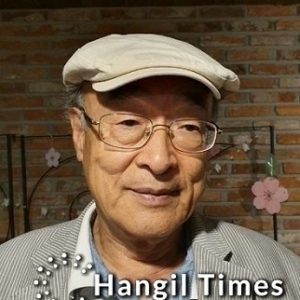[윤여금 기자] 황산벌은 660년 7월 백제 5천 결사대가 신라 5만군과 맞서 싸운 전장으로 백제와 신라의 패망을 결정지은 장소지만 우리 역사상 두 번에 걸쳐 중요한 전투가 있었다. 다른 하나는 936년에 후백제가 고려와 맞서 싸웠던 곳이다. 전투가 벌어진 곳이 평지여서 오늘날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6세기 중엽 당시 신라는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당나라는 고구려의 서부를 공격할 때 신라는 고구려의 남부 를 공격 방안을 제시하여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이끌어 냈다. 고구려의 서쪽과 남쪽을 동시에 공격하여 고구려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전략이었다.
신라가 당나라와 고구려를 공격할 경우 텅 빈 신라 땅을 백제가 공격한다면 신라가 당나라를 도와 고구려를 공격하는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기에, 이에 신라와 당나라는 먼저 백제의 항복을 받아내고, 뒤이어 고구려를 양쪽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하였다. 고로 백제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 정세로 백제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성충(成忠미상~656)은 죽기 전 황산벌 전투가 있기 4년 전인 656년에 나당연합군의 침공이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의자왕에게 최후로 한 마디 건의를 올렸다. “만약 다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육로든 침현을 넘지 못하게 하고, 수군은 기벌포 언덕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성충은 나당연합군이 동서 양쪽에서 쳐들어 올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동쪽은 침현, 곧 탄현에서 막고, 서쪽은 기벌포, 곧 금강 하구로 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당부했다. 그러나 의자왕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백제의 백강의 서쪽과 탄현의 동쪽
백제의 백강의 서쪽과 탄현의 동쪽
백제의 마지막 의자왕(義慈王 재위641~660)은 무왕의 맏아들이며, 효성이 지극하고 형제들간에 우애가 깊어 해동증자(海東曾子)로 불렀다. 의자왕은 즉위 후 신라를 공격하여 신라가 차지하고 있던 옛 가야 땅을 대부분 수중에 넣고, 경주 바로 앞까지 진출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신라는 당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난국을 타개 하고자 했다.
645년 당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하자 친당정책을 추진하고 있던 신라는 당나라를 도와 남북 양쪽에서 고구려를 공격했다. 이 때 의자왕은 그 빈틈을 타고 신라 서쪽 7개 성을 차지해버렸다. 이렇게 되자 당나라는 백제가 있는 한 신라와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거듭된 당나라의 경고에도 의자왕이 계속해서 신라의 변경을 공격하자 당나라는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 다음, 신라와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660년 있었던 나당연합군의 백제침공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
660년 3월 당나라가 수군과 육군 13만명을 파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격변을 알리는 황산벌 전투의 서막이 되어, 당나라 13만여 명은 660년 3월에 배 1,900여 척 규모의 대군이 중국을 출발해 서해를 건너 덕물도에 6월 21일 상륙했다.
 당의 공격로와 신라의 공격로
당의 공격로와 신라의 공격로
5만 명의 신라군은 5월 26일 서라벌을 출발 했고, 무열왕은 남천경(지금의 경기도 이천)에 도착하고 무열왕 태자 김법민을 배 100여 척 규모의 신라 수군과 함께 서해(지금의 인천시 웅진군)의 덕물도로 파견하여 당군을 영접하게 했다. 신라군은 금돌성(경북 상주)에서 출발하여 탄현(대전 우슬설, 금산 진산설, 금산 고산탄지설)을 넘어 진격하였다.
계백(미상~660)은 의자왕과 신하들이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응할지를 하는 사이 신라 군대는 탄현을 넘고, 당나라 군대도 백강 안으로 들어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자왕은 계백 장군에게 결사대 5천명을 주어 황산에 나아가 신라군을 막게 했다.

신라군보다 먼저 황산벌에 도착한 계백은 진영을 설치한 다음 “월나라 구천이 5천명의 병력으로 오나라의 70만 대병을 격파한 바 있다. 우리 또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고 백제 군사들의 사기를 붇돋아 주었고 신라군과 4번 싸워 모두 승리하였다.
이에 신라군은 인해전술로 5만의 군사가 5천을 향해 돌진하자 계백 장군도 백제 군사도 힘을 다 썼으나 중과부적(衆寡不敵)으로 백제군은 패하고, 계백 장군도 최후를 맞이하였다.
백제의 무기는 원거리 무기와 근거리 무기가 있었다. 칼, 창, 낫 도끼는 근거리 무기라면, 활, 화살은 원거리 무기라 할 수 있다. 칼은 대도가 유행하였다. 대도에는 칼자루 끝에 둥근 고리가 달린 둥근 고리 자루칼과 둥근 고리 안에 용이나 봉황이 들어가기도 하고 삼엽문이 들어가기도 했다. 방어용 무기는 갑옷, 투구, 방패 등이 있었다.
 백제군사박물관 내부 '용무늬고리자루칼, 둥근고리자루칼'
백제군사박물관 내부 '용무늬고리자루칼, 둥근고리자루칼'
‘삼국사기’ 속의 계백은 백제 사람이다. 벼슬하여 달솔이 되었다. 계백은 장군이 되어 죽음을 각오한 군사 5천명을 뽑아 이를 막고자 하였다. 계백이 말하기를 “한 나라의 사람으로서 당과 신라의 대군을 맞게 되었으니, 나라의 존망을 알 수가 없다. 내 처와 자식들이 잡혀 노비가 될까 염려 된다.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죽어서 흔쾌한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마침내 처자식을 모두 죽였다.
황산의 벌판에 이르러 3개의 군영을 설치하고 신라 군대를 만나 전투하기에 이르러, 계백은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지난날 구천은 5천명으로 오나라의 70만 무리를 격파하였다. 오늘 마땅히 각자 힘써 싸워 승리함으로써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자.”라고 하였다. 마침내 격렬히 싸우니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해 냈다. 신라군은 이에 퇴각하였다. 이와 같이 진격하고 퇴각하길 네 차례에 이르러, 계백은 힘이 다하여 죽었다고 전해진다.
 삼국사기황산벌 주요 전적지는 660년 7월 9일(음력) 현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일원으로 황령산성과 청둥리산성 사이의 분지로 추정되며 지금도 주변에 황산리, 관동리라는 자연촌이 있다.
삼국사기황산벌 주요 전적지는 660년 7월 9일(음력) 현 논산시 연산면 신양리 일원으로 황령산성과 청둥리산성 사이의 분지로 추정되며 지금도 주변에 황산리, 관동리라는 자연촌이 있다.
오늘날 부적면 수락산은 계백장군의 목이 잘린 곳이라하여 수락산이라 불리며, 그의 충절을 높이 사 충혼산 또는 충훈산이라고도 부른다. 부적면 가장골른 계백장군을 가매장했다고 전해진다. 부적면 계백장군의 묘는 볼마루 북쪽 산기슭에 묘소가 있다. 부적면 중장골은 백제와 신라가 격렬하게 싸운 후 죽은 군사들은 매장한 곳이라 한다.
 계백장군유적전승지 충남도 기념물 제74호로 1989년 지정했고, 논산 부적면 신풍리에 위치한 백제군사박물관이다.
계백장군유적전승지 충남도 기념물 제74호로 1989년 지정했고, 논산 부적면 신풍리에 위치한 백제군사박물관이다.
성동면 궁골은 의자왕이 경관이 좋은 곳에 궁궐을 지었다고 하여 궁궐 또은 궁곡동이라 부른다.
부창동 어설미는 의자왕이 풍류를 즐겼다 하여 어상산이라 했는데 변하여 어설미라 부른다.
부창동 황화대와 황화산의 황화산성은 의자왕이 유연했던 곳이라 전해오며,피난와서 조회를 했다고 전해진다. 황화산에는 의자왕이 앉았던 큰 바위를 황화대라고 불리우며 전해지고 있다.
채운면 용머리산은 산의 형태가 용머리처럼 생겼당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의자왕이이 산에 꽃을 많이 심게 하였고 꽃이 피는 봄에 이 곳에 와서 놀았다고 한다. 채운면 꽃미는 의자왕이 꽃을 심고 철다라 왔다고 하여 매꽃미, 매화산, 화산이라고 부른다.
 하정열 작가, 군인에서 별을 노래하는 미술가로 '제30회 개인전'
[이승준 기자]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주제로 우주의 신비를 한지에 먹과 유채로 환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우주화가 하정열 하정열 작가는이달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제30회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일수도 있고, 어린 시절 꿈꾸던 가슴속의 별일 수도 있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
하정열 작가, 군인에서 별을 노래하는 미술가로 '제30회 개인전'
[이승준 기자] 해와 달 그리고 별을 주제로 우주의 신비를 한지에 먹과 유채로 환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우주화가 하정열 하정열 작가는이달 25일까지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갤러리에서 '제30회 개인전'을 진행 중에 있다.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일수도 있고, 어린 시절 꿈꾸던 가슴속의 별일 수도 있다.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우...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독립유공자를 찾아서 113] 북으로부터도, 남으로부터도 핍박 받은 남북합작 이상주의자 '장건상'
[이승준 기자] 장건상, 1882 ~1974, 대통령장 (1986)우리들은 각 혁명단체, 각 무장대오, 전체 전사 급 국내외 동포로 더불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더욱 공고 확대하면서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전면적 무장투쟁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한다. 전체 전사, 전체 동포 제군! 일체의 준비와 행동은 다 이 반일투쟁의 조직 발동을 중...

 충남-시즈오카 발전적 미래 만들어 나가자!
충남-시즈오카 발전적 미래 만들어 나가자!
 HD현대인프라코어, 튀르키예 국방부서 대형 굴착기 39대 수주
HD현대인프라코어, 튀르키예 국방부서 대형 굴착기 39대 수주
 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 개최
중기부,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사전점검 회의 개최
 검찰 "돈 봉투 수수 의심 전.현직 의원 7명에게 3차 출석 요구"
검찰 "돈 봉투 수수 의심 전.현직 의원 7명에게 3차 출석 요구"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경남도, 외국인근로자의 조기 정착지원 강화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 ‘집중력의 배신’ 출간
중앙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한덕현 교수, ‘집중력의 배신’ 출간
 아일릿, 데뷔기 담은 자체 콘텐츠 ‘SUPER REAL ILLIT’ 첫 공개
아일릿, 데뷔기 담은 자체 콘텐츠 ‘SUPER REAL ILLIT’ 첫 공개
 GT클래스, 이고 레이싱팀 정회원 우승
GT클래스, 이고 레이싱팀 정회원 우승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화성의 '용연'은 용두 바위에서 유래

 목록으로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