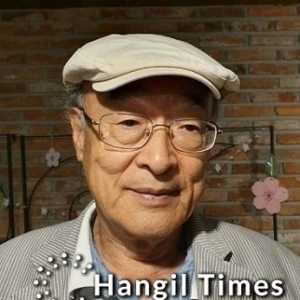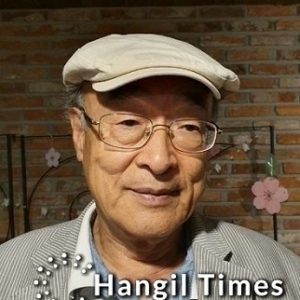[박광준 기자] '홍무예제'는 1381년(홍무 14) 중국 명나라에서 국가의 예법(禮法)을 기록해 편찬한 책으로, 이 책에는 중앙과 지방에서 준수해야 할 국가의 각종 의식, 복식과 품계, 공문서 양식 등이 실려 있다.
'홍무예제'는 명나라 태조가 1381년에 중국 각자의 유학자들을 불러모아 편찬한 국가의 예식집을 14세기에 인쇄한 것이다. 편찬한 황재 태조의 연호인 '홍무'를 따서 '홍무예제'라고 했다. 고려 말부터 조선의 세종이 '국조오례의'를 제정하기 전까지 국가적 예법의 기준으로 널리 활용됐다. 조선 전기 우리나라와 중국의 외교 실태와 ㅇ{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명나라는 원나라로부터 억압받던 한족의 문화를 다시 일으키고 국가 통치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예제’를 정비했고 '예의정식(禮儀定式)' '대명집례(大明集禮)' '홍무예제' 등 예법을 기록한 책들을 편찬했다.
'홍무예제'는 국가나 황제에게 경사가 있을 때의 의식[進賀禮儀], 사신이 오갈 때의 의식 [出使禮儀], 관리의 복식과 품계[服色.文武階勳], 공문서 서식[署押體式], 녹봉 관련 규정[官吏俸給] 등 모두 1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홍무예제', 조선 전기(추정), 28.8×19.0cm, 보물, 2003년 송성문 기증
'홍무예제', 조선 전기(추정), 28.8×19.0cm, 보물, 2003년 송성문 기증
조선왕조는 ‘유교식 국가 전례’를 구현하고, 국가의 통치 규범을 확립하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홍무예제'를 준용(準用)했다. 1381년 중국에서 편찬된 '홍무예제'가 우리나라에 언제 전해졌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홍무예제'가 편찬되고 19년이 지난 1400년(정종 2)에 이르러 '조선왕조실록'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국가의 예법을 관장하는 예조(禮曹)에서 이 책을 표준으로 청할 만큼 널리 알려졌다.
태종(太宗, 재위 1400~1418) 연간에는 '홍무예제' 준용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1408년(태종 8) 임금의 장인 민제(閔霽)가 세상을 뜨자, 태종의 비 원경왕후(元敬王后, 1365~1420)의 상복(喪服) 문제가 대두되었다. 당시에는 출가한 딸이 부모를 위해 상복을 입은 전례가 없었는데, 예조는 '홍무예제'의 “출가한 딸은 본래 부모를 위해 1년간 상복을 입는다”는 내용을 따르자고 청하자, 태종은 이를 윤허했고 민간에서도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한 1412년(태종 12)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에 사용되는 신주(神主)를 만들 때와 1416년(태종 16) 조정 관리들이 입는 관복 제도를 개편할 때에도 모두 '홍무예제'를 따르도록 했다.
조선왕조는 '홍무예제'를 수용하되 당시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 노력했다. '홍무예제'의 공문서 관련 사항을 다룬 '행이체식'에서는 다른 관청으로 문서를 보낼 때, 서로 존대한다는 의미에서 ‘신(申)’이라는 글자를 사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임금과 신하 사이에서만 ‘신’이라는 글자를 사용했기에 대신들은 이를 다른 글자로 바꾸자고 청했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문서를 가리키는 ‘신문(申聞)’을 ‘계문(啓聞)’으로, 임금의 명령을 전달하는 관원을 가리키는 ‘지신사(知申事)’를 ‘도승지(都承旨)’로 바꾸었다. 세종대에 '홍무예제'가 명나라의 지방에서 적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조선시대 국가 의례의 표준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그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15세기 후반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할 때 주요 참고 서적으로 활용됐다./사진-박광준 기자
 [박정기의 공연산책 364] 극단 이구아구, 정재호 연출의 '스쁘라브카 열람'
예술공간 혜화에서 극단 이구아구의 안톤 체홉 작 여무영 각색 번역 정재호 연출의 스쁘라브카 열람을 관람했다.안똔 체홉(Анто́н Че́хов, Anton Chekhov,1860~1904)은 러시아의 의사, 소설가, 극작가이다. 1867년 고향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예비학교를 다닌 후, 1869년 고전 교육을 목표로 하는 타간로크 인문학교에 입학한다.1879년 8년 ...
[박정기의 공연산책 364] 극단 이구아구, 정재호 연출의 '스쁘라브카 열람'
예술공간 혜화에서 극단 이구아구의 안톤 체홉 작 여무영 각색 번역 정재호 연출의 스쁘라브카 열람을 관람했다.안똔 체홉(Анто́н Че́хов, Anton Chekhov,1860~1904)은 러시아의 의사, 소설가, 극작가이다. 1867년 고향에서 고대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예비학교를 다닌 후, 1869년 고전 교육을 목표로 하는 타간로크 인문학교에 입학한다.1879년 8년 ...

 세계 각국에 충남 방문의 해 알린다
세계 각국에 충남 방문의 해 알린다
 LS, 국내외 대학생 봉사단원 모집
LS, 국내외 대학생 봉사단원 모집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중기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서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4 Job Festival 취업준비 함께하세종' 개최
세종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4 Job Festival 취업준비 함께하세종' 개최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경남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사 역량 강화한다
 한길타임즈 CG
한길타임즈 CG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서평] 낮은 곳으로 흐르는 '사랑의 위력'
 르세라핌, 2곡 동시에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 획득
르세라핌, 2곡 동시에 일본 레코드협회 ‘플래티넘’ 인증 획득
 김도훈호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전 치르러 출국
김도훈호 월드컵 예선 싱가포르전 치르러 출국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건강칼럼] 중년의 어깨통증은 오십견?
 '문화가 있는 날'의 덕수궁 오후
'문화가 있는 날'의 덕수궁 오후

 목록으로
목록으로